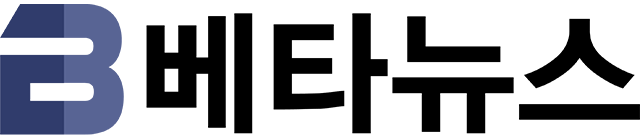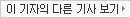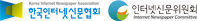입력 : 2012-07-09 09:54:15
벌써 한참 시간이 흘렀지만 일본 IT 유통의 중심이라는 아키하바라와 미국 실리콘밸리 근처 베스트바이를 처음 들렀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지금도 마찬가지만,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엄청난 규모와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매장에 무엇보다 놀랐다. 특히 빌딩 같은 대형 매장에서 다양한 회사 제품을 가리지 않고 파는 이른바 양판점이라는 형태는 당시 사회 초년병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도 하이마트와 전자랜드라는 전자전문양판점들이 문을 열게 된다. 당시에는 골목마다 전파상이라는 형태의 수리를 겸하는 작은 매장이나, 삼성, LG 등 단일 브랜드의 제품만을 파는 매장들이 있던 터라 양판점은 큰 인기를 끌게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이마트는 시장 지배력이 삼성과 LG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는 1999년 당시, 모회사이던 대우전자가, 대우 제품은 물론 심지어 경쟁사 제품까지 한데 모아놓은 발상의 전환이 성공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당 부분은 앞서 설명한 일본 양판점들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지금껏 하이마트하면 “전자제품 전문매장”이나 무엇보다 “메이커를 가리지 않고 골라서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이마트 성공의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다. 한마디로 모회사의 약점을 반대로 유통의 자유로운 발상으로 해결한, 기가 막힌 한 수인 셈이다. 아직도 삼성의 디지털 플라자나 LG 하이프라자에서 경쟁사 제품은 찾아볼 수 없는 것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물론 대우전자라는 태생적인 한계는 반대로 튼튼한 회사가 아니라는 약점으로 작용해서 경영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1대 주주인 유진그룹과 2대 주주이지만 사실상 창업자라고 할 수 있는 선종구 회장 사이에 볼썽사나운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었는데, 결국에는 유통 강자인 롯데쇼핑이 지분의 65.25%인 1,540만 주를 1조 2480억 원에 사서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
하이마트만 하더라도 직원 수 2,600명에 전국 매장이 310여 개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301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지간한 곳에는 빠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덕분에 가전 유통 시장의 공룡으로 매출 약 3조 4천억 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약 36% 수준이다. 여기에 기존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롯데몰 등의 가전 시장 점유율을 더하면 40%를 훌쩍 넘는다.
최근 롯데마트가 가전 시장을 공략하기 마트 안에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숍인 숍(Shop in Shop) 형태의 ‘디지털파크’를 크게 늘려온 터라 말 그대로 하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마트가 사업보다는 취약한 재무구조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면, 바다 건너 베스트바이는 전형적인 사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들린다. 고객들이 베스트바이라는 오프라인 매장에 들려 보기만 하고, 막상 제품은 아마존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덕분에 2년 연속 매출이 쪼그라들면서, 주가 역시 같은 기간 무려 33%나 떨어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에는 미 전역에 걸쳐 50개 매장의 문을 닫고, 직원 400명을 감원했으며, 최근에는 이와는 별도로 직원 2,400명을 또 다시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
사실 대형 오프라인 매장의 부진은 어느 나라이건 비슷한 상황이다. 굳이 매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매장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이미 지난 2009년, 당시 베스트바이의 가장 강력한 경쟁업체이던 서킷시티가 셔터를 내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싶다.
PC하나만 보더라도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은 장점이 크게 나뉜다. 예를 들어 굳이 설치가 필요 없는 노트북은 온라인 매장이 어울린다. 하지만 아직도 모니터와 키보드를 본체에 연결하는 것이 어려운 이들도 많다. 이런 구매자들에게는 친절한 설명과 설치가 보장되는 오프라인 매장이 제격이다. 온라인 주문을 하고 기다림이 지루한 이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가격경쟁력에서 온라인 매장에 주도권을 빼앗긴 오프라인 매장들은 애플이나 삼성 모바일처럼 AS센터와 교육, 그리고 구매가 한 군데서 이뤄지는 체험형 매장이 요즈음 유행이기는 하지만, 이건 제품군이 단출한 애플이면 몰라도, 대형 TV 하나만 해도 수많은 모델이 선보이는 가전 업체로서는 따라하기 힘든 일이다.
마트, 홈쇼핑, 백화점, 인터넷 그리고 가전 전문매장까지 유통의 풀 라인업을 갖춘 롯데의 행보와 반대로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베스트바이의 엇갈린 발걸음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싶다.
베타뉴스 김영로 (bear@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목록
목록-
 위로
위로